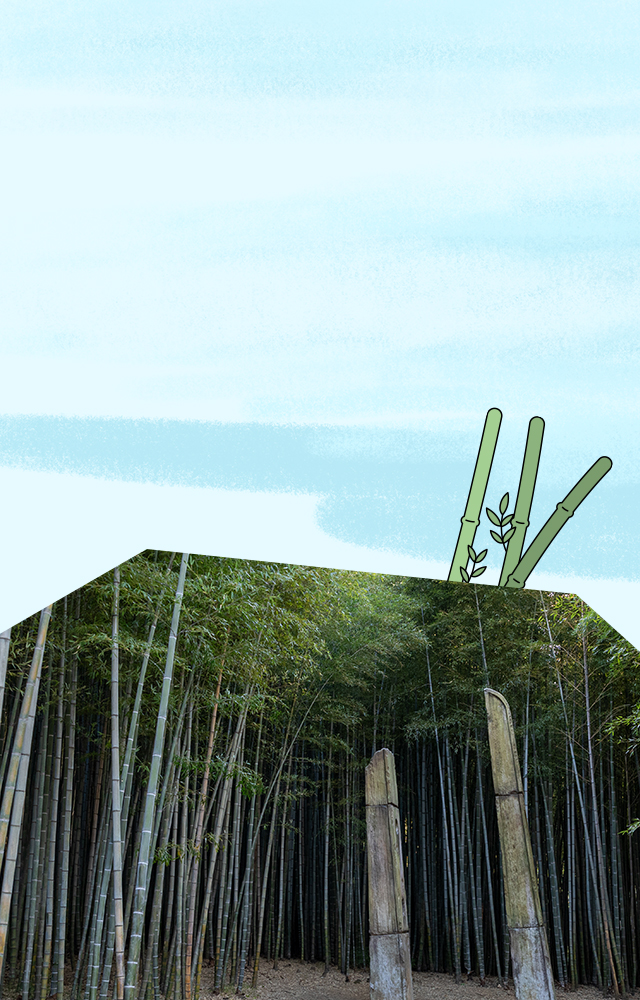
글. 이효정 사진. 조병우
바람결을 따라 여린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가 났다. 청량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강한 바람을 만나 세찬 소리로 바뀌었다가 어느 순간 고요해지기를 수차례. 여기는 대나무가 가득한 아홉산숲이다.
아홉산은 9개의 봉우리를 품고 있어 붙여진 순우리말 이름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361m로, 낮고 오밀조밀한 산세를 지녔다. 이런 산기슭에 남평 문씨 일가가 9대에 걸쳐 가꾸고 지켜온 아홉산숲이 있다. 조성된 숲은 52만 8,952㎡(16만 평) 규모로, 거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이곳의 역사는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임진왜란의 공신으로 왕에게 하사받은 땅에 문씨 일가가 자리 잡고, 금강송, 편백, 참나무, 대나무 등을 심고 가꿨다. 대대를 이어 숲을 지켰다. 일제강점기에는 나무를 베어 가는 일본순사들에게 나무 대신 놋그릇을 내어놓기도 하고,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불어온 개발의 물결에서도 묵묵히 숲을 보호했다. 그들의 단단한 의지로 지켜낸 숲은 2004년 산림청의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에도 선정됐다.
당시까지 여전히 민간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숲은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의 촬영지로 사용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개방되었는데 일반인들이 찾아와 숲을 손상하자 2015년부터는 숲을 최소 훼손 단위로 개방하며 관리 차원에서 유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홉산숲의 매표소를 지나면 하늘로 쭉쭉 뻗은 대나무의 군락을 만날 수 있다. 가느다란 대나무들이 형성한 이 군락을 따라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기를 5분이 되지 않아 금강송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다. 목을 뒤로 꺾어야 한눈에 들어온 금강송은 기장군에서 지정한 보호수로, 수령이 400년 이상이라고 한다. 금강송 아래에는 줄기가 옆으로 퍼져 누워 자란다는 누운주목이 금강송과 어울리게 자라고 있다. 이 모습에 이른 아침 뉜 햇살이 더해지자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모습이 펼쳐졌다. 이 나무들이 문씨 일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순사들에게 놋그릇을 내어 주고 지켜낸 소중한 유산이다.
대나무와 관련된 말 중 ‘우후죽순(雨後竹筍)’이 있는데, 이는 비가 내리고 나면 죽순들이 여기저기 솟아난다는 뜻이다. 일들이 무성하게 발생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은 대나무가 빠르게 자라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자라고 높은 번식력을 지닌 대나무 사이에 동그란 모양의 공터가 있다면 사람들은 쉬이 이 장소를 지나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금강송 군락을 지나 만난 첫 번째 맹종죽숲에 그런 공간이 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은 둥근 이 자리에 아홉산 산신령의 영험이 있다고 여겼고, 마을에 궂은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굿판을 벌였다고 한다.
굿터 주변으로는 대나무 품종 중 가장 굵다는 맹종죽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두 손으로 움켜쥐기 힘든 두께를 지닌 이 맹종죽은 100여 년 전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표면에 흑갈색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나무 사이로는 커다란 돌기둥 2개가 솟아 있다. 이 돌기둥은 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에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사용되었던 촬영 소품으로, 현재 그대로 남겨져 관광객들에게 인기 포토존이 되고 있다. 또한, 아홉산숲에서는 <군도: 민란의 시대>, <대호>,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었다.
맹종죽숲 사이에는 중간중간 대나무 그루만 남아 있는 곳이 많았다. 순간 입구에서 본 배너의 문구가 떠올랐다. ‘대나무 낙서 절대 금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대나무에 낙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낙서를 방지하기 위해 낙서가 생긴 나무를 모두 베어낸다더니 그 자리인 것 같았다. 그 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놀라울 정도였다. 국내외 유명 관광지의 문화재나 나무에 낙서하는 일이 빈번한데, 굳이 그러는 이유가 뭘까? 어느 심리학자가 낙서는 존재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낙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든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일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만약, 이곳에 당신이 방문한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길을 나선 후 영화 <대호> 촬영으로 지어진 서낭당을 지나니 두 개의 갈림길이 나왔다. 왼쪽은 편백숲, 오른쪽은 평지대밭으로 가는 길이다.
아홉산숲의 메인으로 꼽히는 평지대밭은 1만㎡(3,000평)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오직 맹종죽만이 심어져 있다. 1960~1970년대에 부산 동래의 식당에서 수거한 잔반을 여기에 뿌리고, 때로는 부산 시내의 분뇨차를 이용해 비료를 사용해 이곳을 키워냈다. 전국에서 맹종죽 단일 품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하늘과 햇볕까지 모두 가려질 정도의 겹겹이 겹친 굵고 높은 대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하늘로 시원하게 쭉쭉 뻗은 대나무의 단단한 기둥은 바람에 흔들림 없이 곧게 서 있지만, 하늘에 맞닿은 대나무 줄기는 바람에 흔들려 하늘하늘 움직였다. 태양의 높이에 따라, 각도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왔다 갔다 출렁이며 춤을 췄다. 중간중간 마련된 의자에 앉아 바람의 소리,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한없이 바라보며 평화를 즐겼다. 재잘거리는 관광객의 소리가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주기도 했다. 크게 숨 한번 내쉬고 들이켜며 초록의 청량함을 느껴보기 충분한 공간이다.
숲 탐방의 마지막은 ㄱ자형의 한옥, 관미헌이었다. ‘고사리처럼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담은 이곳은 산주 일가의 종택으로,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한옥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어졌다. 현재도 실제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에 예사롭지 않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 나무는 현재 산주의 조부가 1920년대에 장가들면서 처가로 산행을 다녀왔을 때 얻어온 은행 열매로 싹을 틔웠다고 한다. 나무와 함께 이색적인 울퉁불퉁한 모양의 대나무를 만났다. 대나무 마디가 마치 거북이 등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갑죽이란 이름을 지닌 대나무다. 맹종죽보다 짧은 길이의 대나무는 1950년대 말 중국, 일본을 거쳐 들여와 뿌리를 이식한 것이다. 구갑죽은 희소성이 높은 대나무로 예전에는 이곳이 유일한 자생지였다고 한다. 지금은 중국과의 교류로 다른 곳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 구갑죽을 끝으로 2시간 정도의 여정이 끝이 났다.
400여 년이라는 시간과 사람의 의지가 합쳐져 완성된 아홉산숲.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대대손손 이어졌기에 지켜낼 수 있었던 곳. 억척스러울 만큼의 집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자연의 모습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입장료 하나로 이곳을 쉬이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사유지인 이곳의 빗장은 다시 닫힐지 모를 일이다. 하나의 가문이 정성으로 쌓아온 숲을 관람객인 우리도 함께 지켜낼 필요가 있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평화로움을 만끽해준 그 순간을 위해서 말이다.



비록 ‘나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대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다. 나무처럼 생겼다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대나무는 풀이다. 단단한 줄기가 나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부피 생장을 하지 않는다. 나이테도 없고 속이 비어 있어서 나무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나무는 생장이 시작되면 수십 일 내에 빠르게 자라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굵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