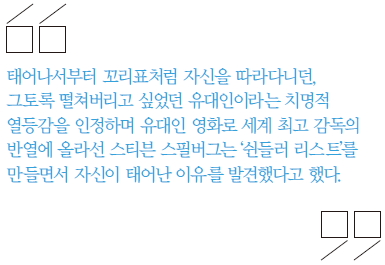올봄엔 스티븐 스필버그(스티븐 앨런 스필버그) 얘기를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지난 2월 말 그가 감독을 맡은 영화 ‘더 포스트’가 국내 개봉한 데 이어 3월 28일엔 그가 연출을 맡은 최초의 가상현실 블록버스터 ‘레디 플레이어 원’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따돌림당하던 유대인 소년에서 세계적인 영화의 거장, 각본가, 영화 프로듀서이자 ‘드림웍스’의 공동 창립자가 된 스티븐 스필버그의 성공은 아이러니하게도 ‘열등감’에서 시작했다. 어린 시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잡았던 8mm 카메라는 그의 인생은 물론이고 할리우드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세계적인 스타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필모그래피에서 한 편의 영화 같은 그의 성공기를 들여다보았다.
커리어 up | 글 박근희 조선일보 ‘friday’ 섹션 기자
 유대인 감독, 유대인 영화로 우뚝 서다
유대인 감독, 유대인 영화로 우뚝 서다
“다른 어떤 영화가 아니라 바로 이 영화로 상을 받았다는 건 제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1994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7개 부문을 수상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수상 소감엔 힘이 넘쳤다. 그가 자신에게 유독 특별한 작품이었음을 강조한 영화는 바로 유대인 학살을 다룬 ‘쉰들러 리스트’.
태어나서부터 꼬리표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토록 떨쳐버리고 싶었던 유대인이라는 치명적 열등감을 인정하며 유대인 영화로 세계 최고 감독의 반열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면서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발견했다고 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1946년 12월 18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유대인 부모 아널드 스필버그와 리아 아들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아널드 스필버그는 전기기술자이면서 컴퓨터 전문가였고 어머니 리아 스필버그는 전직 피아니스트였다. 스티븐 스필버그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가 9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그의 가족은 꽤 오랜 기간 애리조나주 교외에서 살았는데 당시 그가 살던 마을에 유대인은 오직 그의 가족뿐이었다. 그가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이 켜 있지 않은 곳은 오직 우리 집뿐이었다”고 할 만큼 유대인 거주 지역이 아닌 기독교도들 속에서 그는 외로운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친구들이 ‘더러운 유대인’, ‘돈만 밝히는 유대인’이라고 놀리고 따돌릴 때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태생적 열등감과 싸워야 했다. 실제로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대충 일곱 살 때부터 아홉 살 때까지 정통파 유대교도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며 “유대인이란 점에 주눅이 든 데다 다른 사람(미국 사회의 백인들)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고 유대인이어서 때때로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학교에 다니면서 스카우트 활동과 야구에도 열중했지만 주된 관심사는 오직 영화였다. 12살 되던 해 그는 아버지의 8mm 카메라를 이용해 가족 소풍과 캠프 여행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앵글을 실험해보며 영상 만들기에 빠져들었다.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 세 여동생을 주연으로 짧은 공포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수업시간에도 책에 만화 그리기에 몰두했고 공부는 낙제를 면할 정도만 했다.
고교 재학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그는 더욱 외로워졌고 영화는 그에게 유일한 삶의 낙이 되어주었다. 학교에선 자신을 따돌렸던 친구들을 역으로 자신의 영화에 출연시키며 영화의 힘을 알게 된 그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투자해 8mm 및 16mm 영화를 여러 개 만들기에 이른다. 공상과학소설과 천문학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그의 첫 번째 장편영화 ‘불빛’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동네 극장을 빌려 상영해 단 하루 만에 제작비 500달러를 뽑아내며 남다른 사춘기를 보낸다.
대학 시절 만든 ‘앰블린’으로 유니버설사와 계약
영화교육의 명문인 남가주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던 스필버그는 성적이 좋지 않아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대학 생활도 평범하진 않았다. 주 3일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몰래 ‘잠입’해 구경할 정도로 영화에 빠져 있었다. 이 시기 그는 앨프리드 히치콕과 같은 감독들이 일하는 것을 훔쳐보며 영화감독의 꿈을 키워간다.
대학 시절인 1968년에 만든 ‘앰블린’이란 22mm 영화로 베니스영화제, 애틀랜타영화제에서 수상했으며 당시 유니버설사의 텔레비전 부문 책임자인 시드니 샤인버그는 그 영화에 감명받아 그와 7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는 샤인버그 밑에서 ‘마커스 웰비’, ‘게임의 이름’, ‘콜롬보’ 등의 드라마를 제작하며 영화감독이 되기 위한 전초 단계인 양 열심히 드라마 제작에 몰두한다. 1971년 텔레비전 영화인 ‘주말의 명화’ 시간에 방영될 영화 ‘결투’를 감독하게 되는데 텔레비전용 영화이긴 하지만 그는 16일간 예산 35만 달러로 제작해 유럽과 일본 영화관 상영에서 매출 500만 달러를 기록한다. ‘결투’를 계기로 해외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다.
‘결투’ 방영 후 그는 영화제작 제의를 수없이 받았지만 휴식 후 자신의 영화 대본을 만들어 1974년 유니버설영화사의 코미디 ‘슈가랜드 특급’을 만든다. 안타깝게 흥행엔 실패했지만 스필버그는 이 작품을 계기로 프로듀서 리처드 자눅, 데이비드 브라운과 운명처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조스’의 제작을 맡게 된다.
29세에 ‘조스’ 감독 후 숨 가쁘게 써내려간 할리우드 흥행사
1975년 선보인 ‘조스’는 촬영 여건의 문제 등으로 당초 제작비인 350만 달러보다 2배에 가까운 제작비가 들었지만 개봉 후 미국에서 1개월 만에 6,000만 달러 수익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뿐 아니라 해외수출로 매출 4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이 영화 한 편으로 스필버그는 29세의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비록 영화계 지식 엘리트들과의 갈등으로 아카데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말이다. 이후 ‘미지와의 조우’로 오스카상 후보에 다시 오르지만 역시 감독상은 우디 앨런에게 돌아가며 고배를 맛본다.
1981년에 만든 ‘레이더스’는 스필버그가 할리우드에서도 ‘돈만 밝히는 장사꾼’으로 통하던 조지 루카스와 만나 탄생시킨 영화. 2,000만 달러에 불과한 저예산으로 완성시켰는데 전 세계적으로 3억 6000만 달러 수익을 올려 파라마운트사가 생긴 이래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 스필버그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썼던 기법이 영화적으론 성공을 거두면서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굳힌다.
이후 ‘E.T.’, ‘레이더스’, ‘인디애나 존스’ 등으로 역대 흥행기록을 차례로 깨뜨렸다. 유대인이며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잦은 공포감에 시달렸던 그의 열등감은 창조력의 원천이기도 했다. 공포의 경험은 ‘조스’로, 소외감은 ‘E.T.’로 승화됐으며 유대인이라는 자각은 ‘쉰들러 리스트’를 낳았다. 배짱과 냉철한 비용수익 분석력, 신중한 자산 관리 등을 그의 성공 비결로 꼽지만 무엇보다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창의성 덕분이었다.
2013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 중 한 명으로 등극하며 할리우드의 흥행 보증수표가 된 그는 말한다. “나는 희망을 밤이나 낮이나 품어둔다. 그러기에 그 희망은 현실로 이뤄지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