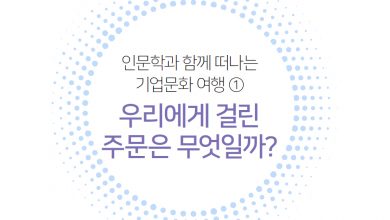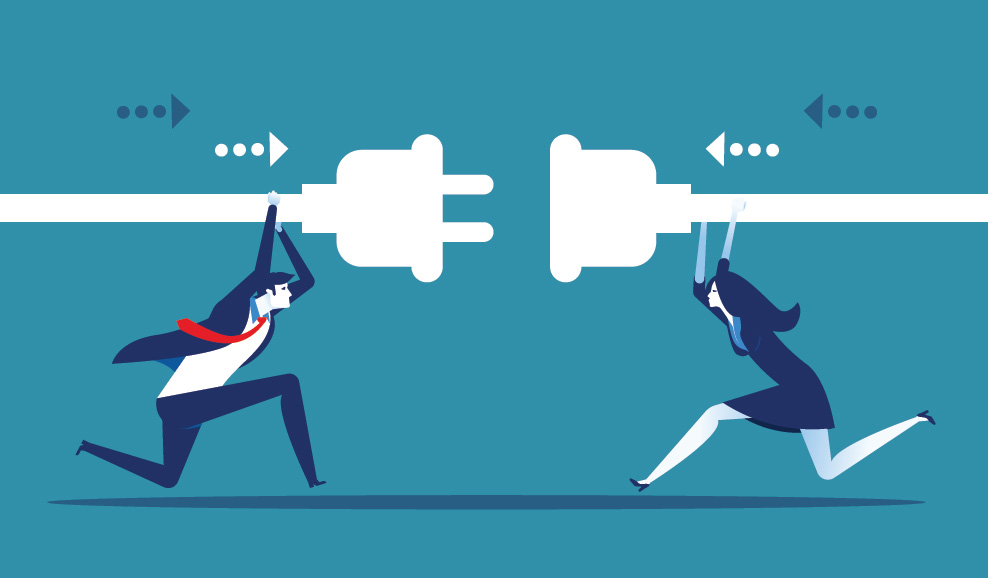
옛날 옛날에 작은 도시가 있었어.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작은 강에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늘 그 다리를 건너서 출근을 하고 물건을 나르고 친척들을 방문하곤 했어. 그런데 그 다리가 낡아서, 정부에서는 다리를 수리하기로 했어. 그러려면 먼저 교통량을 알아봐야 해서, 행정관에게 한 달 동안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도록 했어. 공정성을 위해 시민들 중 한 명을 선발해서 따로 수를 세어본 후 서로 대조하게 했지. 한 청년이 이 작업을 맡게 되었고, 행정관과 청년은 매일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는 정오에 서로의 숫자를 대조해보았는데, 신기한 건, 매일 하나씩 숫자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였어. 청년의 수가 늘 하나가 적었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작업은 잘 끝났어.
뭐, 숫자 하나의 차이야 교량 설계에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테니까. 행정관은 궁금했지. 시청 문을 나서는 청년과 동행하며 물었어.
“왜 자네 계산은 숫자 하나가 늘 모자랐나?”
청년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기업문화 오디세이 | 글 신상원 기업문화 테라피스트, 『기업문화 오디세이』 저자, 신과기업SHIN&company 대표
숫자에 포함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등가교환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 우리는 가게에서 가격표에 적힌 금액을 주고 물건을 사지만 그 물건이 가족에게 줄 선물이라면 가격표를 떼고 포장해 마음을 담아 준다. 이를 인류학에서는, 숫자로 환산되는 ‘교환 경제’와 구분하여 선물 경제, 즉 ‘증여 경제’라고 한다. 증여 경제에서는 교환되는 물건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인간적인 가치가 부착된다. 다양한 감정, 명예, 역사, 권한 등 무한한 가치가 마치 영혼이나 원혼처럼 주고받는 대상에 붙어 다닌다. 교환되는 물건은 ‘인간의 마음’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거꾸로 ‘주면’, ‘받아야 할 의무’도 같이 발생하게 된다. 교환가치와 달리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갚아야 한다. 선물이나 축의금을 받자마자 돌려줄 수는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는 오랜 시간에 걸친 주고받음 속에서 문화를 만들게 된다.
모욕의 조직문화와 신뢰의 조직문화
모욕의 조직문화가 발생하는 원리도 여기에 있다. 모욕 역시 증여적 가치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욕을 증여하면 부하직원에겐 바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부하직원은 이를 윗사람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조직에는 서열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위로 돌려줄 때 윗사람에게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모욕으로 돌려받게 될 공포를 무의식적으로 느낀다. 부하직원은 시간을 두고 이를 아랫사람에게 돌려준다.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 그 사람은 다시 아래로 주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조직 전체에 ‘갚는다’. 이런 순환 체계 속에서 모욕의 기업문화가 만들어진다. 불신의 조직문화도 마찬가지다.
같은 원리로 신뢰의 조직문화와 책임의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먼저 주어, 갚아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먼저 신뢰하고, 먼저 책임지면, 그것이 주는 행위가 된다. 신뢰와 책임은, 모욕과 달리 윗사람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가치다. 신뢰와 책임지는 모습을 돌려받은 윗사람은, 역시 시간을 두고 더 크게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받은 선물을 어떻게 돌려줄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다. 문화의 법칙에 따른 원리이자 공식이다. 인류학과 사회학의 위대한 저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Essar sur le Don』의 발견이다. 도덕이나 윤리와 구분되는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가치는 ‘교환가치와 부착되어서만’ 움직인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 교환가치가 우선시되는 조직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자주 만나고 친하고 소통하게 한다고 해서 조직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업무 지시, 일의 수행, 성과의 평가, 보상, 승진과 해고 등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예컨대, 업무 지시와 평가는 증여 행위다. 그 업무를 숫자 지표로만 줄 수는 없다. 즉, 교환가치로만은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숫자에 ‘당신을 믿어’라는 신뢰를 하나 더 얹어줄 수도 있고,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라며 권한과 책임을 얹어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불신을 부착해줄 수도 있고, 권한 없이 책임만 얹어줄 수도, 모욕과 화를 저주처럼 붙여줄 수도 있다. 물론 이미 만들어진 조직문화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마르셀 모스도 아메리카 대륙 북서 해안 원주민 사회의 증여 체계를 거대한 순환의 고리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고리이기에, 중간에 끊길 수가 있다고. 그때 다른 사회의 문화가 유입될 수 있었다.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당신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돌려주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한 인터넷 기업 회장의 상식을 초월하는 모욕과 폭력이 화제다. 아마도 그 행동에 가담하고 그 행동이 가능한 조직문화가 더욱 기이하게 여겨지리라. 그 문화가 만들어진 원리는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문화의 시작은 아마 이야기 속의 청년이 갖고 있을 것이다.
서두에 소개한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일까? 청년은 어떻게 답했을까?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
1) 청년은 혐오스런 얼굴로 얘기했어. 다리를 건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숫자로 세기 싫었다고.
2) 청년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떨린 음성으로 말했어.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매일 아침 그 다리를 건넌다고, 청년에게 그 사람은 결코 1이라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청년의 스토리는, 류시화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서 차용. 원작의 결론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