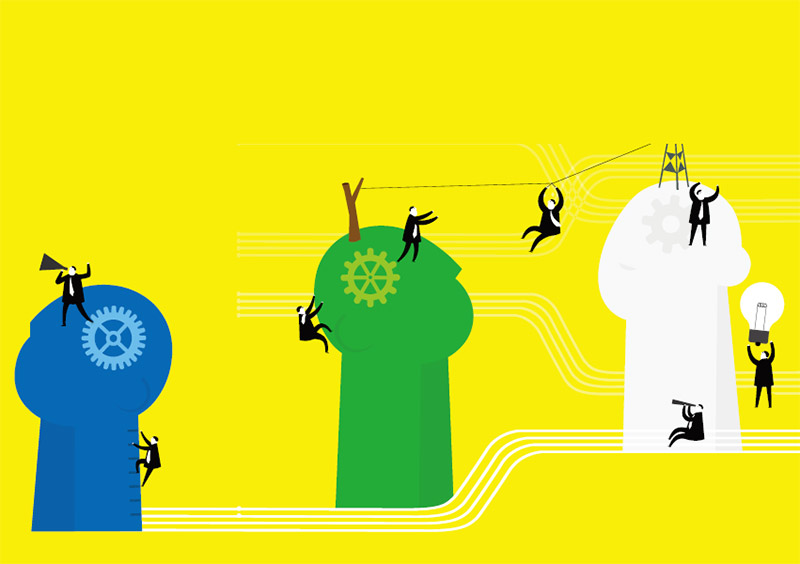
Opinion Column오늘을 이야기하다
소통은 조직의 공기와 같다
위암 선고를 받았다. 정밀진단을 위해 가장 큰 종합병원을 찾았다. 환자가 밀려 있어 엿새 정도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힘드셨죠?” 이 한마디에 울컥했다. 위로가 이어졌다. “사진을 보니 크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놓치는 것 없도록 볼게요.” 신뢰할 수 있게 했다.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도 ‘여기 들어갈 때 뻑뻑할 거다’, ‘잘 참고 있다’며 수시로 알려주고 격려했다. “여기 보이는 것 좀 떼어낼게요. 육안으로 볼 때 암세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직검사 해볼게요.” 세심한 배려가 눈물겨웠다. 소통의 힘이 위대하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Opinion Column 3 | 글 강원국 글쓰기 작가
소통이 잘되는 조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답답하지 않은 조직이다. 회사에 출근할 때 가슴이 답답한가? 일요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무거운가? 그렇다면 내가 속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마다 문화라는 게 있다. 부서에도 분위기라는 게 있다. 어느 조직에 가면 구성원의 표정이 밝고 활기차다. 그런가 하면 먹구름만 잔뜩 머금은 듯 무겁고 우중충한 조직도 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정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때 정보는 지식, 경험, 자료, 아는 사실 모두를 포함한다. 이런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는가? 정보가 차별 없이 공유되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기업 조직에서 정보는 공기와 같다. 회사원은 정보로 숨을 쉰다.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보고하고 회의하고 보고서를 쓰고 메일을 작성한다. 정보의 ‘정’ 자는 한자 ‘마음 정(情)’을 쓴다. 회사원은 정보에서 단지 지식이나 자료만 얻지 않는다. 정을 느낀다. 정보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 정에 굶주린다.
투명해야 한다
소통이 잘되는 조직의 첫 번째 특징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이다. 쉬쉬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정보를 얻으며 회사 사정에 고루 밝다. 신입사원 시절 상사를 잘 만났다. 그분은 부서장회의에서 들은 얘기를 가감 없이 말해줬다. 내가 동기 모임에 가서 느낀 게 있다. ‘그게 그런 거였어?’,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의외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 알고 있는 나는 부서장급 신입사원이었다.
반대로 소통이 안 되는 조직에서는 윗사람만 잘 안다. 술자리에서만 정보가 활발하게 오간다. 아랫사람들은 술자리에서 퍼즐 꿰맞추기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비공식, 유비통신이다. 기업에서 임원을 하며 승강기에서 듣게 되는 직원들의 푸념도 대부분 비슷했다. 조직은 왜 그러는가.
활발하게 유통되어야 한다
소통이 잘되는 조직의 두 번째 특징은 정보의 활발한 유통이다. 정보는 화폐와 같다. 유통되면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고여 있는 정보는 정보로서 가치를 잃는다. 보고, 조회, 회의, 토론, 회식, 사보 등을 통해 정보가 돌아다녀야 한다. 정보 교환에도 단계가 있다. 1단계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2단계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다. 3단계는 ‘분석’하는 것이다. 4단계는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마지막 5단계는 ‘해법 도출’이다.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나는 것 아냐?’(느낌), ‘뭐가 문제야?’(사실), ‘왜 일어난 거야?’(분석),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평가), ‘어떻게 해야 돼?’(해법 도출) 이런 과정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미국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말대로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60% 정도는 잘못된 소통에서 비롯된다.”
공유되어야 한다
소통이 잘되는 조직의 세 번째 특징은 정보의 공유다. 구성원이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을 넘어, 정보의 의미와 배경, 맥락을 동일하게 이해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배경, 맥락에 관해 공감대를 이룬다. 그렇지 않으면 알기는 아는데 각기 딴소리를 하고 따로 논다.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내가 몸담았던 조직 중에 정보 공유가 잘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이 있었다. 잘되는 조직은 상사가 부하에게 지시할 때 지시 사항은 1분간 얘기하고 9분 동안 그것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해준다.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은 9분 지시에 1분 설명이다.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움직인다. 알아야 자기 일이다.
정보는 정이다
소통이 잘되는 조직의 네 번째 특징은 정보로 정을 나눈다는 점이다. 이런 조직의 구성원은 서로에게 관심이 많다. 또 서로를 잘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 나아가 일과 시간도 공유한다. 내가 이만큼 남을 위해서 하면 남도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돕는다. 이로써 신뢰의 공동체를 이룬다. 무슨 말이라도 털어놓고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서로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관계, 즉 라포르 상태가 된다. 청와대에서 일할 때 대통령이 나를 찾으면 우리 방 행정관들이 내 자리로 모여들었다. ‘대통령께서 이런 걸 물으시면 이렇게 답하세요.’ 혹여 비서관이 실수할까 봐, 대통령께 꾸중 들을까 염려해서다.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고 부서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위나 아래나 행복하다.





